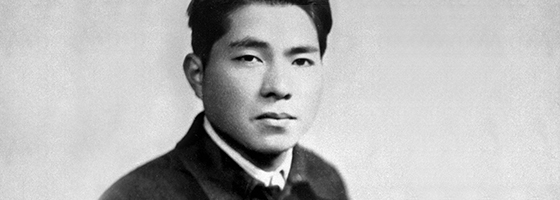불교철학자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혁명은 전 인류의 숙명전환도 가능케 합니다.
- 홈
- 불교철학자
- 불교 관련 에세이
- 불법(佛法)의 생사관(生死觀)
불법(佛法)의 생사관(生死觀) 1993. 9. 24 / 21세기 문명과 대승불교, 하버드대학교 강연에서 발췌
그리스의 철인(哲人)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萬物)은 유전한다.”는 유명한 말은 남겼습니다. 확실히 인간계(人間界)든 자연계든 모든 것은 변화와 변화의 연속이며 한 순간도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견고한 금석(金石)이라 해도 장기간 놓고 본다면 세월에 의한 마멸작용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 사회의 놀랄 만한 변화상은, ‘전쟁과 혁명의 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누구나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불교의 눈은 이 변화의 실상(實相)을 ‘제행(諸行:여러 현상)은 무상(無常:항상 변화)”이라고 포착하였습니다. 이것을 우주관에서 말하면 ‘성주괴공(成住壞空)’, 즉 하나의 세계가 성립하여 유전하고 붕괴하여 다음의 성립에 이른다고 설합니다.또 이것을 인생관에서 논한다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사고(四苦), 즉 태어나 살아가는 괴로움, 나이 드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의 유전(流轉)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고(四苦), 특히 생(生)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 사(死)의 문제는 예로부터 모든 종교나 철학이 생겨나는 원인이었습니다.
석존(釋尊)이 출가(出家)하게 된 동기라고 알려진 ‘사문출유(四門出遊)’의 에피소드나, 철학을 ‘죽음의 학습’이라 한 플라톤의 말은 너무나도 유명하며, 니치렌(日蓮) 대성인도 “우선 임종(臨終)의 일을 배우고 후에 타사(他事)를 배워야 한다.”(어서 1404쪽)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이렇게 무거운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무엇보다도 죽음에 의해 자기의 유한성(有限性)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한한 ‘부(富)’나 ‘권력’을 손에 넣은 인간이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 숙명(宿命)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유한성을 자각하고 죽음의 공포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영원성에 참획(參劃)하여 동물적 본능인 삶의 방식을 초월한 하나의 인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가 인류사와 함께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死)를 망각한 문명’이라고 일컫는 근대는, 이 생사(生死)라는 근본과제에서 눈을 돌려 죽음을 오로지 기피해야 할 범죄자와 같은 위치로 몰아세우고 말았습니다. 근대인에게 죽음은 단순한 생의 결여나 공백 상태에 지나지 않았고, 생(生)이 선(善)이라면 사(死)는 악(惡), 생은 유(有)이고 사는 무(無), 생이 조리(條理)이고 사는 부조리(不條理), 생이 명(明)이고 사는 암(暗) 등등 죽음은 모두 마이너스 이미지를 받았습니다.그 결과 현대인은 죽음으로부터 호된 보복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금세기가 브레진스키 박사가 말한 ‘메가데스(Megadeath)의 세기’가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를 망각한 문명’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즈음 뇌사(腦死)나 존엄사, 호스피스, 이상적인 장례식, 또 큐브라 로스 여사의 ‘임사의학(臨死醫學) 연구 등에 보인 높은 관심도는, 누구나 죽음의 의미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재검토를 요구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문명은 크게 착각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사는 단순히 생의 결여(缺如)가 아니라, 생과 나란히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 전체는 ‘생명’이며 삶의 방식인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사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생과 나란히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 전체는 ‘생명’이며 삶의 방식인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사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사를 응시하며 올바르게 위치를 부여하는 생명관, 생사관, 문화관의 확립이 곧 21세기 최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법성(法性)의 기멸(起滅)을 설합니다. 법성이란 현상(現像)의 오저(奧底)에 있는 생명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합니다. 생사 등 일체의 사상(事象)은 그 법성이 연(緣)에 닿아 기(起) 즉 출현하고, 멸(滅) 즉 소멸하면서 유전을 반복한다고 설합니다. 따라서 사(死)란 인간이 잠으로 내일을 위한 활력을 비축하듯이 다음에 올 생을 충전하는 기간과 같은 것으로, 기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생과 마찬가지로 혜택이며 즐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설합니다.
그러므로 대승불전(大乘佛典)의 정수인 법화경(法華經)은 생사가 유전하는 인생의 목적을 ‘중생소유락(衆生所遊樂)’이라 하여, 신앙이 투철하면 생도 환희이고 사도 환희이며, 생도 유락이고 사도 유락이라고 설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도 ‘환희 중의 대환희’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전쟁과 혁명의 세기’가 남긴 비극은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인이 외형만의 변혁에는 없다는 교훈을 명확히 남겼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기에는 이러한 생사관 생명관의 변혁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